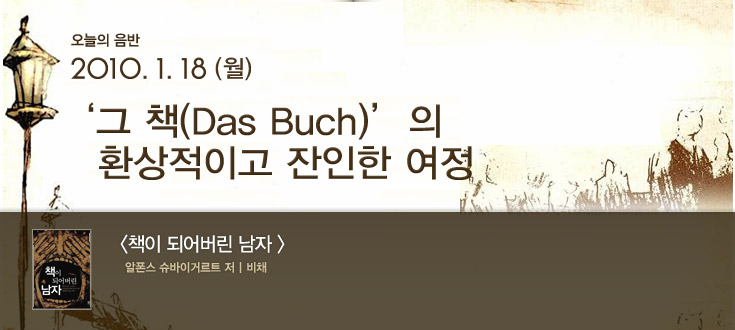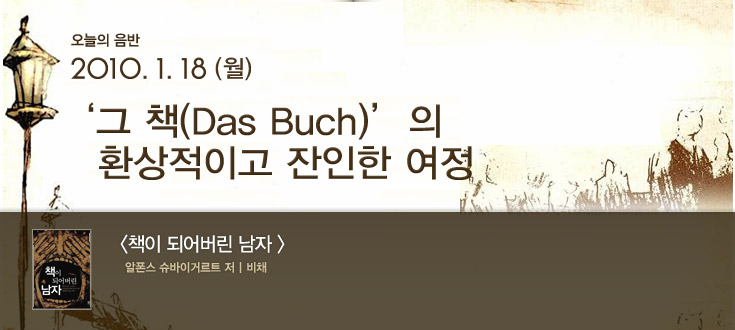|
<책이 되어버린 남자>는 사람이 책이 되어버리고, 책이 된 사람이 편집자를 강간하고, 책 수집가, 비평가를 살인하는 기괴한 이야기다. 바로 '그 책(Das Buch)'은 책이 된 사람이며, 이는 곧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소설은 벼룩시장에 나온 임자 없는 기이한 책을 손에 쥔 한 남자, 수많은 책을 사 모으고 책 세계에 빠져들어 고립되어버린 그 사람의 환상적 여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책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책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책을 읽고 있는가?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책의 세계에 대한 잔인한 항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책이 되어버린 남자> 속에는 소유하고 싶은 책을 손에 넣기 위해 골동품상과 목사를 살해하기도 한 ‘돈 빈센트’란 사람이나, 계단, 마당, 헛간에 이르기까지 집 전체가 온통 책으로 채워진 피렌체의 유명한 사서 ‘마글리아베치’, 사후에 무덤 주위를 책으로 에워싸 장식했던 출판업자 ‘알더스 마누티우스’의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며, ‘프란츠 카프카’에서 ‘얀그레스호프’,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에 이르는 작가들의 책에 대한 멋진 담론과 인용문들이 즐비하게 배열되기도 한다.
책이 삶의 한 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면 책이 되어버린 남자, ’비블리’의 변신이 엄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일이다. “독서라는 세균이 요 몇 년 사이에 그의 피와 살 속에 침투해, 이제는 꼼짝없이 감염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구절은 사실 책벌레, 독서광, 간서치(看書癡)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인 것처럼, 소설 속에서 ‘그 책’의 여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결코 낯설지 않다.
무지하고 편협한 독자로부터 내동댕이쳐지는 ‘그 책’,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오려대는 도서관장의 몰염치함(볼테르의 사후 이렇게 책을 오려내 만든 자료가 6천여 장이나 발견되었단다), 경제적 편익에 경도된 출판사 편집자의 외곬, 음침한 서고에 가치물로서 책을 수장시키는 수집광, 그리고 편견과 독선으로 책의 운명을 마구 떠들어대는 무책임한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책’이 벌이는 잔인한 복수극은 책의 본성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편협한 세상을 향한 자성의 촉구이기도 하다.
새 책을 구입해 펼쳐들 때 종이와 제본, 인쇄 잉크가 어우러져 뿜어내는 그 고유한 냄새가 얼마나 뇌를 흐뭇하게 자극해대는지, 그리고 벽들을 따라 죽 늘어선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이 주는 위안, 책을 읽고 있는 순간만큼의 평온과 세상으로부터의 안전한 격리가 주는 행복감은 책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느낌을 확인시켜준다. “판타지의 왕국으로 통하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것이 바로 책이다!”라는 문장은 바로 이 소설인 ‘그 책(Das Buch)’을 표현하는 한 마디가 될 것이다.
‘카프카’의 말처럼 “집 밖으로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의 책 예찬은 아닐지라도, 책은 우리의 정신을 담는 유형의 그릇이며, 위대한 세계의 기적 중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인화 된 ‘그 책’의 재치 있는 적절한 행위가 상상력 넘치는 발상, 양념처럼 처진 약간의 인문학적 지식과 결합하여 책세상의 모두를 기막히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작품은 현명한 독서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삼 환기시켜준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책을 잊고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저마다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설 환상의 소설이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필리아님'은?
세상의 위협이나 추함에서 격리되어 책에 몰입하는 순간을 커다란 위안인 동시에 평온의 시간으로 여기며, 자기격려와 스스로를 고무하는데 독서만큼 유익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젠 거의 꺾을 수 없는 신념이 되어버린, 그러나 관계의 매혹을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